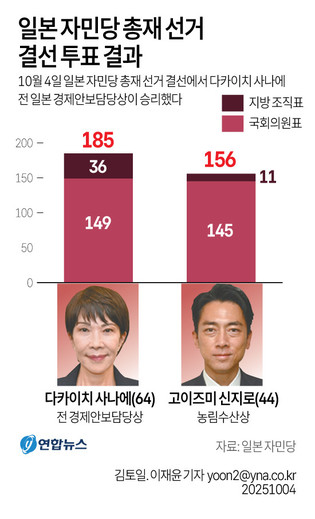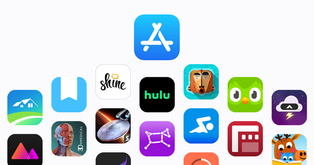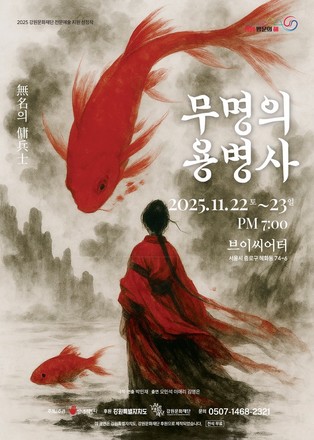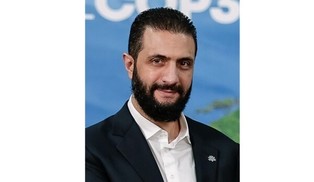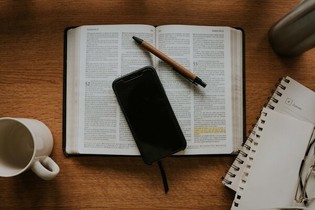속초7.7℃
속초7.7℃ 북춘천-1.7℃
북춘천-1.7℃ 철원-1.3℃
철원-1.3℃ 동두천0.3℃
동두천0.3℃ 파주-1.2℃
파주-1.2℃ 대관령-1.0℃
대관령-1.0℃ 춘천-1.5℃
춘천-1.5℃ 백령도10.5℃
백령도10.5℃ 북강릉4.4℃
북강릉4.4℃ 강릉7.4℃
강릉7.4℃ 동해6.5℃
동해6.5℃ 서울3.6℃
서울3.6℃ 인천4.7℃
인천4.7℃ 원주-1.4℃
원주-1.4℃ 울릉도8.0℃
울릉도8.0℃ 수원2.9℃
수원2.9℃ 영월-3.8℃
영월-3.8℃ 충주-0.5℃
충주-0.5℃ 서산4.6℃
서산4.6℃ 울진4.9℃
울진4.9℃ 청주3.9℃
청주3.9℃ 대전3.6℃
대전3.6℃ 추풍령3.2℃
추풍령3.2℃ 안동-4.0℃
안동-4.0℃ 상주4.6℃
상주4.6℃ 포항4.6℃
포항4.6℃ 군산4.9℃
군산4.9℃ 대구0.8℃
대구0.8℃ 전주4.7℃
전주4.7℃ 울산3.3℃
울산3.3℃ 창원3.5℃
창원3.5℃ 광주4.9℃
광주4.9℃ 부산4.9℃
부산4.9℃ 통영3.3℃
통영3.3℃ 목포5.6℃
목포5.6℃ 여수5.4℃
여수5.4℃ 흑산도10.5℃
흑산도10.5℃ 완도7.0℃
완도7.0℃ 고창3.2℃
고창3.2℃ 순천5.3℃
순천5.3℃ 홍성5.5℃
홍성5.5℃ 서청주0.8℃
서청주0.8℃ 제주10.0℃
제주10.0℃ 고산11.9℃
고산11.9℃ 성산6.2℃
성산6.2℃ 서귀포9.1℃
서귀포9.1℃ 진주-1.7℃
진주-1.7℃ 강화3.0℃
강화3.0℃ 양평-0.4℃
양평-0.4℃ 이천-0.5℃
이천-0.5℃ 인제-0.9℃
인제-0.9℃ 홍천-2.4℃
홍천-2.4℃ 태백2.0℃
태백2.0℃ 정선군-4.6℃
정선군-4.6℃ 제천-2.6℃
제천-2.6℃ 보은0.2℃
보은0.2℃ 천안1.1℃
천안1.1℃ 보령6.1℃
보령6.1℃ 부여3.7℃
부여3.7℃ 금산1.7℃
금산1.7℃ 세종2.7℃
세종2.7℃ 부안6.1℃
부안6.1℃ 임실1.9℃
임실1.9℃ 정읍5.3℃
정읍5.3℃ 남원1.6℃
남원1.6℃ 장수0.2℃
장수0.2℃ 고창군3.7℃
고창군3.7℃ 영광군3.5℃
영광군3.5℃ 김해시2.4℃
김해시2.4℃ 순창군1.9℃
순창군1.9℃ 북창원2.5℃
북창원2.5℃ 양산시2.7℃
양산시2.7℃ 보성군4.0℃
보성군4.0℃ 강진군2.2℃
강진군2.2℃ 장흥0.3℃
장흥0.3℃ 해남1.1℃
해남1.1℃ 고흥1.0℃
고흥1.0℃ 의령군-3.5℃
의령군-3.5℃ 함양군3.1℃
함양군3.1℃ 광양시2.7℃
광양시2.7℃ 진도군2.3℃
진도군2.3℃ 봉화-5.3℃
봉화-5.3℃ 영주-2.4℃
영주-2.4℃ 문경5.0℃
문경5.0℃ 청송군-5.6℃
청송군-5.6℃ 영덕4.2℃
영덕4.2℃ 의성-4.6℃
의성-4.6℃ 구미0.7℃
구미0.7℃ 영천2.2℃
영천2.2℃ 경주시5.5℃
경주시5.5℃ 거창-3.1℃
거창-3.1℃ 합천-1.1℃
합천-1.1℃ 밀양-1.8℃
밀양-1.8℃ 산청5.8℃
산청5.8℃ 거제3.5℃
거제3.5℃ 남해2.8℃
남해2.8℃ 북부산1.5℃
북부산1.5℃
멸치의 회유 떼는 과거처럼 집단을 이루지 않고, 고온화된 수온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남해안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1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멸치 생산량의 60%를 맡아온
남해에서는 그 1도가 치명적이다. 5년 전 1만7000 톤에 달하던 남해 멸치 위판량은 어느새 1만 톤 수준으로 꺾였고, 단가는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기후 변화의 속도는 어민들의 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 ▲사진=연합뉴스 |
제주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속 오징어 배 선장의
만선 풍경은 이제 영상 속에만 남은 오래된 풍경일지도 모른다. 2004년 2000 톤을 넘기던 제주의 오징어 생산량은 최근 3년 연속 500톤을 넘기지 못했고, 지난해엔
435톤에 그쳤다. 이는 전국적 감소세의 축소판이다. 전국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004년 21만 톤에서 지난해 1만3000 톤대로 주저앉으며 20분의 1 수준만 남았다. 2017년 이후
10만 톤 이하로 내려앉은 뒤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멸치와 오징어가 함께 사라진 이유는 서로 닮았다. 해수온의 상승, 인간의 오랜 남획이다. 1990년대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는 한때 풍요를 누렸지만 최근의 고수온은 오히려 그들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어군을 분산시켰다. 유생
밀도도 낮아져 세대를 잇는 힘마저 약해졌다. 멸치 역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속에서 치어가 적응하지
못하며 자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어획량 감소는 곧바로 우리의 식탁에 파문을 일으켰다. ‘금징어’라는 신조어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며, 멸치와 고등어, 갈치까지 수산물 전반의 물가가 상승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수산물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을 기록했다. 연근해 전체 어획량도 1980년대 평균 151만 톤에서
2020년대 93만 톤 수준으로 축소됐다. 고수온의
폭력은 양식장까지 스며들어 작년 집단 폐사 피해액만 1,430억 원에 달했다.
거대한 변화는 멸치와 오징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40년간 멸치·고등어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반면 방어·전갱이·삼치 같은 난류성 어종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어업인의 손끝에서 말리던 오징어, 국물의 주인공 멸치, 겨울 식탁의 고등어 같은 익숙한 풍경들이 조용히 더 멀어지고 있다. 기후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이며,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해지고 있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저작권자ⓒ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